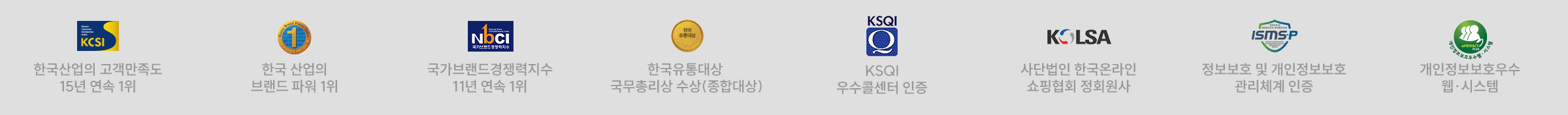YES24 카테고리 리스트
YES24 유틸메뉴
- Global YES24안내보기
-
Global YES24는?
K-POP/K-Drama 관련상품(음반,도서,DVD)을
영문/중문 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Korean wave shopping mall, sell the
English
K-POP/K-Drama (CD,DVD,Blu-ray,Book) We aceept PayPal/UnionPay/Alipay
and support English/Chinese Language service作为出售正规 K-POP/K-Drama 相关(CD,图书,DVD) 韩流商品的网站, 支持 中文/英文 等海外结账方式
中文Exclusive ticket sales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p artists
Global yesticket
어깨배너
1/6
| 결제혜택 |
|---|
| 상태 중고상품 상태안내 | 상 사용 흔적 약간 있으나, 대체적으로 손상 없는 상품 |
|---|---|
| 판매자 |
수사불패
(3명 평가)
|
품목정보
| 발행일 | 1999년 10월 22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03쪽 | 456g | 148*210*30mm |
이 상품의 이벤트 (3개)
중고도서 소개
책소개
목차
예스24 리뷰
<철도원>의 허깨비가 불러들인 하루
99/11/15 이희인(heen@ktcf.co.kr)
눈물이 나기에 기차를 탔다. 덫에 걸린 11월, 하나 둘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소망하는 일은 지독히도 버겁게 느껴졌다.
11월 11일, 오늘의 운세는 내게 할 일도 많고 먹을 일도 많다고 하였던가. 아사다 지로의 <철도원>과 정호승의 신작 시집, 카메라에 흑백필름, 아미나이프에 단감 3개만을 달랑 챙겨 아침 기차에 몸을 실었다. 아침부터 청량리역엔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여덟 편 단편으로 묶인 <철도원>에서 나는 표제작인 '철도원'만을 보름쯤 전에 읽었다. 그 뒤 책의 다른 단편을 읽을 생각도 없이 언젠가 한번쯤 읽었던 기차와 간이역들에 얽힌 작품들을 여기저기 빼들었다. 곽재구의 '사평역에서'를 베껴 보기도 하고 임철우의 '사평역'과 이문열의 '이 황량한 역에서'를 아주 찬찬히 읽어보기도 했다. 윤후명의 '협궤열차'를 읽고 아직 어리숙할 무렵 소래 포구에서 찍은 사진들을 새삼 꺼내 보기도 했으며, 터널을 빠져 나오니 설국이었다, 던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작품도 들춰보았다. 그러면서 자꾸만 어느 궁벽진 곳의 간이역들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태백, 사북, 정선. 그리고 그 어간에 있는 추전, 별어곡, 여량 등이 가고자 하는 역들이었다. '철도원'의 배경은 이제 곧 패쇄될 처지에 놓여있는 산골 간이역이며, 주인공인 오토마츠 역장은 한평생 묵묵히 역을 지켜오다가 다가오는 봄, 낡은 기차와 함께 퇴직을 맞게 될 늙은 사내다. 그러한 즉 내가 찾아가는 역들이란 영락없이 '철도원'의 배경이 될 만한 곳들이었다. 그 중에는 벌써 역무원 하나 없는 무인역이 있는가 하면, 정선선 같은 노선은 재정상 이유로 폐지가 공공연히 논의된 바 있다고 한 즉.
눈보라 몰아치는 정월 초하루 밤, 데운 정종과 눈보라 속 어린 계집애의 환영, 까무룩한 눈발을 비추는 기차의 불빛까지 '철도원'은 좀체 잊기 어려운 이미지들을 마음속에 잔뜩 부려놓았다. '철도원'의 들큰한 냄새가 묻어날 만한 곳으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간이역들을 떠올렸는지, 그건 나로서도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차창 밖으로는, 이제 기꺼이 낙엽의 삶을 받아들이게 될 마른 잎들이 참수를 기다리듯 잔가지마다 위태롭게 붙어 있고, 논밭이거나 강가에서 무엇들을 태우는지 길고 하얀 연기들이 허공으로 피어올랐지만 11월 냉랭한 대기는 좀처럼 덥혀지지 않았다.
내가 앉은 뒷자리에는 일행의 부탁을 일언지하 거절하여 끝내 자리를 바꿔주지 않던 고집스런 노인네가 앉았고, 차창 밖을 보며 그가 불러대는 끊이지 않는 노래가 있었다. <애수의 소야곡>같은 것도 간간이 흘렀지만 끊어질 듯 이어지는 그 구성진 흥얼거림은 분명 엔가였다. 미쪼구찌 겐조 같은 일본영화에 곧잘 흘러나오던 그 흥얼거림들. 네모진 화덕을 가운데 두고 감자며 밥을 끓여 먹으며 흥얼흥얼 노래들을 읊어대는 오래 전 일본 사람들. 나는 그렇게 또다시 가방에서 <철도원>을 꺼내 들곤 하였다.
여덟 편 단편들은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때때로 감상이 지나쳐 사실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도 따뜻하고 살 만한 세상'을 애써 그리려 한 나머지 곳곳에 신파적인 냄새를 풍기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을 풀어내는 방식이 개인적이고 사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적절한 상황과 이야기 틀을 마련하고 있어 소설의 본분에 꽤 충실한 느낌이다. 과연 여덟 편 중 네 편씩이나 드라마화할 만하였다.
예미, 함백 부근에 이르러 냇물은 적황색으로 바뀌고 지붕이며 하늘은 온통 잿빛이었다. 한때 석탄 산업의 흥성과 함께 호황을 구가하던 탄광 마을을 굽어보며 그 황량한 역사(驛舍)의 역사(歷史)들이 꼭 나와 무슨 관련이라도 있는 듯 애절한 생각마저 들었다. 기차가 다시 사북, 태백 쯤 이르자 벌겋던 냇물들이 어느새 감람빛으로 바뀌어 있다. 자연은 자연대로 제 빛깔과 모양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야쿠자 말단에 기생하는 인간이라든가 별 볼일 없는 소매치기 인생, 외국 지사로 쫓겨가거나 정년퇴직을 앞둔 샐러리맨 등 아사다 지로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현기증 나는 문명에서 변방을 서성이는 인간군상들이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상실감은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며 때때로 환영과 허깨비를 만나는 것도 그리움이 사무치는 데서 비롯되는 착시일 터이다. 그러한 만남이 자아내는 눈물들이란 그지없이 소박하고 소슬하기만 하다.
이별하는 골짜기라는 별어곡(別於谷)역에서 단감 두 개를 깎아 먹고, 정선선 단축운행으로 끝내 찾아갈 수 없었던 여량역과 아우라지를 못내 아쉬워하며, 장이 서지 않는 정선장터 좌판에 앉아 메밀전병에 막걸리 한 주발을 들이켰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예미로 향하던 버스에서 우연히 철로반에 다닌다는 한 사내를 만났다. 사내의 느닷없는 제의로 그의 친구가 운영하는 읍내 치킨집에서 뚝딱 맥주 천을 또 마셨다. 시간이 되어 아예 치킨집 배달차를 얻어 타고 예미역에 다달아 이제 막 플랫폼에 접속하는 기차에 올라탈 수 있었다. 사람 드문 탄광 지대라 타지 사람도 그토록 반갑다던 형들 앞에 나는 내내 의심의 눈초리를 풀지 않았었다. 손에 쥐어진 형님들 이름과 전화번호가 다음을 기약하고 있었다. 그들도 <철도원>의 주인공들만큼이나 소슬한 사람들이었다.
아닌게 아니라, 그것은 <철도원>이 불러들인 허깨비 같은 하루였다. 눈에 다 담아오지 못한 산골 집들과 벌거벗은 나무들이 불현듯 하나하나 되살아 오르는 듯싶다. 하루 동안 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고 느낀 듯, 그래서 하루만에 아주 폭삭 늙어버린 느낌이다. 어쩌겠는가, 나이 들어감이 반드시 추해짐을 의미하는 건 아닐 바에야 천천히 음미하며 맞을 밖에. 겨울, 눈 내리는 정월 어느 밤, 데운 정종과 단감 몇 개를 바리바리 싸들고 자미원역 철로반에 근무한다는 사내를 찾아가 보리라. 눈물이 나거든 기차를 타 보시라.
11월 11일, 오늘의 운세는 내게 할 일도 많고 먹을 일도 많다고 하였던가. 아사다 지로의 <철도원>과 정호승의 신작 시집, 카메라에 흑백필름, 아미나이프에 단감 3개만을 달랑 챙겨 아침 기차에 몸을 실었다. 아침부터 청량리역엔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여덟 편 단편으로 묶인 <철도원>에서 나는 표제작인 '철도원'만을 보름쯤 전에 읽었다. 그 뒤 책의 다른 단편을 읽을 생각도 없이 언젠가 한번쯤 읽었던 기차와 간이역들에 얽힌 작품들을 여기저기 빼들었다. 곽재구의 '사평역에서'를 베껴 보기도 하고 임철우의 '사평역'과 이문열의 '이 황량한 역에서'를 아주 찬찬히 읽어보기도 했다. 윤후명의 '협궤열차'를 읽고 아직 어리숙할 무렵 소래 포구에서 찍은 사진들을 새삼 꺼내 보기도 했으며, 터널을 빠져 나오니 설국이었다, 던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작품도 들춰보았다. 그러면서 자꾸만 어느 궁벽진 곳의 간이역들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태백, 사북, 정선. 그리고 그 어간에 있는 추전, 별어곡, 여량 등이 가고자 하는 역들이었다. '철도원'의 배경은 이제 곧 패쇄될 처지에 놓여있는 산골 간이역이며, 주인공인 오토마츠 역장은 한평생 묵묵히 역을 지켜오다가 다가오는 봄, 낡은 기차와 함께 퇴직을 맞게 될 늙은 사내다. 그러한 즉 내가 찾아가는 역들이란 영락없이 '철도원'의 배경이 될 만한 곳들이었다. 그 중에는 벌써 역무원 하나 없는 무인역이 있는가 하면, 정선선 같은 노선은 재정상 이유로 폐지가 공공연히 논의된 바 있다고 한 즉.
눈보라 몰아치는 정월 초하루 밤, 데운 정종과 눈보라 속 어린 계집애의 환영, 까무룩한 눈발을 비추는 기차의 불빛까지 '철도원'은 좀체 잊기 어려운 이미지들을 마음속에 잔뜩 부려놓았다. '철도원'의 들큰한 냄새가 묻어날 만한 곳으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간이역들을 떠올렸는지, 그건 나로서도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차창 밖으로는, 이제 기꺼이 낙엽의 삶을 받아들이게 될 마른 잎들이 참수를 기다리듯 잔가지마다 위태롭게 붙어 있고, 논밭이거나 강가에서 무엇들을 태우는지 길고 하얀 연기들이 허공으로 피어올랐지만 11월 냉랭한 대기는 좀처럼 덥혀지지 않았다.
내가 앉은 뒷자리에는 일행의 부탁을 일언지하 거절하여 끝내 자리를 바꿔주지 않던 고집스런 노인네가 앉았고, 차창 밖을 보며 그가 불러대는 끊이지 않는 노래가 있었다. <애수의 소야곡>같은 것도 간간이 흘렀지만 끊어질 듯 이어지는 그 구성진 흥얼거림은 분명 엔가였다. 미쪼구찌 겐조 같은 일본영화에 곧잘 흘러나오던 그 흥얼거림들. 네모진 화덕을 가운데 두고 감자며 밥을 끓여 먹으며 흥얼흥얼 노래들을 읊어대는 오래 전 일본 사람들. 나는 그렇게 또다시 가방에서 <철도원>을 꺼내 들곤 하였다.
여덟 편 단편들은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때때로 감상이 지나쳐 사실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도 따뜻하고 살 만한 세상'을 애써 그리려 한 나머지 곳곳에 신파적인 냄새를 풍기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을 풀어내는 방식이 개인적이고 사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적절한 상황과 이야기 틀을 마련하고 있어 소설의 본분에 꽤 충실한 느낌이다. 과연 여덟 편 중 네 편씩이나 드라마화할 만하였다.
예미, 함백 부근에 이르러 냇물은 적황색으로 바뀌고 지붕이며 하늘은 온통 잿빛이었다. 한때 석탄 산업의 흥성과 함께 호황을 구가하던 탄광 마을을 굽어보며 그 황량한 역사(驛舍)의 역사(歷史)들이 꼭 나와 무슨 관련이라도 있는 듯 애절한 생각마저 들었다. 기차가 다시 사북, 태백 쯤 이르자 벌겋던 냇물들이 어느새 감람빛으로 바뀌어 있다. 자연은 자연대로 제 빛깔과 모양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야쿠자 말단에 기생하는 인간이라든가 별 볼일 없는 소매치기 인생, 외국 지사로 쫓겨가거나 정년퇴직을 앞둔 샐러리맨 등 아사다 지로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현기증 나는 문명에서 변방을 서성이는 인간군상들이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상실감은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며 때때로 환영과 허깨비를 만나는 것도 그리움이 사무치는 데서 비롯되는 착시일 터이다. 그러한 만남이 자아내는 눈물들이란 그지없이 소박하고 소슬하기만 하다.
이별하는 골짜기라는 별어곡(別於谷)역에서 단감 두 개를 깎아 먹고, 정선선 단축운행으로 끝내 찾아갈 수 없었던 여량역과 아우라지를 못내 아쉬워하며, 장이 서지 않는 정선장터 좌판에 앉아 메밀전병에 막걸리 한 주발을 들이켰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예미로 향하던 버스에서 우연히 철로반에 다닌다는 한 사내를 만났다. 사내의 느닷없는 제의로 그의 친구가 운영하는 읍내 치킨집에서 뚝딱 맥주 천을 또 마셨다. 시간이 되어 아예 치킨집 배달차를 얻어 타고 예미역에 다달아 이제 막 플랫폼에 접속하는 기차에 올라탈 수 있었다. 사람 드문 탄광 지대라 타지 사람도 그토록 반갑다던 형들 앞에 나는 내내 의심의 눈초리를 풀지 않았었다. 손에 쥐어진 형님들 이름과 전화번호가 다음을 기약하고 있었다. 그들도 <철도원>의 주인공들만큼이나 소슬한 사람들이었다.
아닌게 아니라, 그것은 <철도원>이 불러들인 허깨비 같은 하루였다. 눈에 다 담아오지 못한 산골 집들과 벌거벗은 나무들이 불현듯 하나하나 되살아 오르는 듯싶다. 하루 동안 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고 느낀 듯, 그래서 하루만에 아주 폭삭 늙어버린 느낌이다. 어쩌겠는가, 나이 들어감이 반드시 추해짐을 의미하는 건 아닐 바에야 천천히 음미하며 맞을 밖에. 겨울, 눈 내리는 정월 어느 밤, 데운 정종과 단감 몇 개를 바리바리 싸들고 자미원역 철로반에 근무한다는 사내를 찾아가 보리라. 눈물이 나거든 기차를 타 보시라.
책 속으로
출판사 리뷰
추천평
육친의 정과 사랑, 선량함으로 채색된,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이 절묘하게 묘사되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훈훈해진다.
나라 신문
나라 신문
「철도원」에는 줄곧 눈이 내리고 있다. 혹은 문장 뒤켠에서 눈을 느낄 수 있다. 그 추위는, 인생의 그것과도 비슷하다.
산케이 신문
산케이 신문
눈물 많은 사람은 장소를 가려가며 읽는 게 좋을 것 같다. 잠자리가 최적의 독서 장소. 좋은 꿈을 꿀 수 있을 테니까.
마이니치 신문
마이니치 신문
탁월한 스토리 구성, 확실한 문체, 뛰어난 표현력, 그야말로 주옥 같은 여덟 편. 각 편마다 읽는 이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일간 현대
일간 현대
- 상품정보 부정확 (카테고리 오등록/상품오등록/상품정보 오등록/기타 허위등록)
- 거래 부적합 상품 (청소년 유해물품/기타 법규위반 상품)
- 전자상거래에 어긋나는 판매사례 : 직거래 유도
구매하신 상품의 상태, 배송, 취소 및 반품 문의는 판매자에게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 배송 구분 |
판매자 배송
|
|---|---|
| 배송 안내 |
|
반품/교환 안내
※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반품/교환 방법 |
|
|---|---|
| 반품/교환 가능기간 |
|
| 반품/교환 비용 |
|
| 반품/교환 불가사유 |
|
| 소비자 피해보상 |
|
|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
|





.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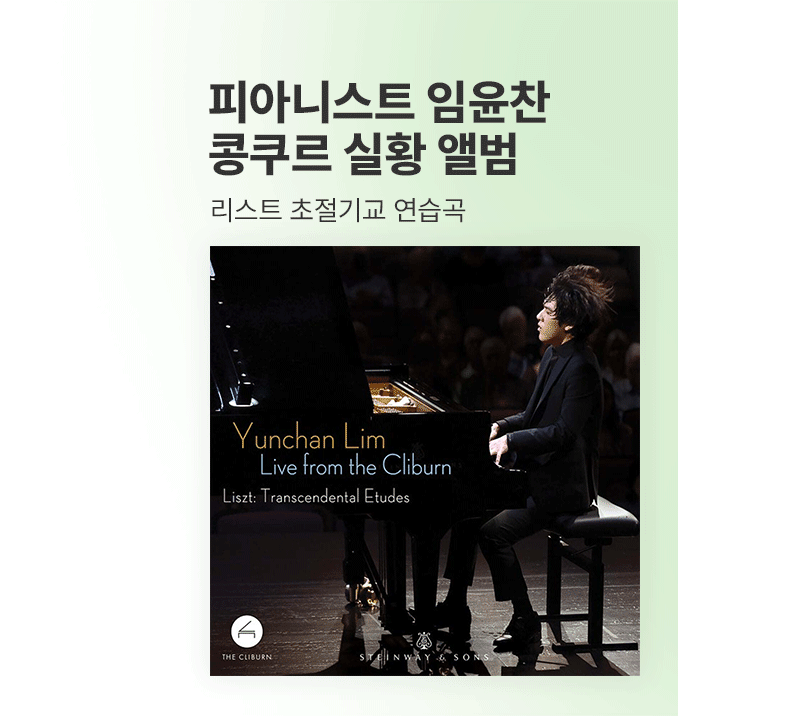




![[중고샵] 매장ON! 대구물류편: 버뮤다대구지대](http://image.yes24.com/images/00_Event/2021/0302usedshop/bn_720x360.jpg)
![[중고샵] 매장ON! 매장 배송 온라인 중고 서비스](http://image.yes24.com/images/13_EventWorld/186962_73.jpg)
![[중고샵] 판매자 배송 중고 추천 인기샵 특별전](http://image.yes24.com/images/00_Event/2020/0527used/bn_720x36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