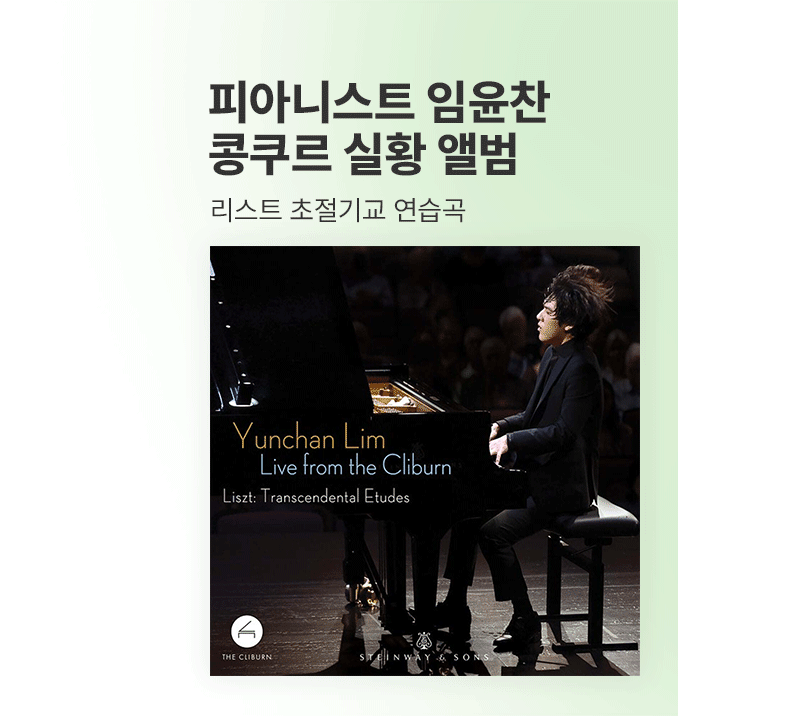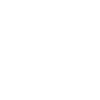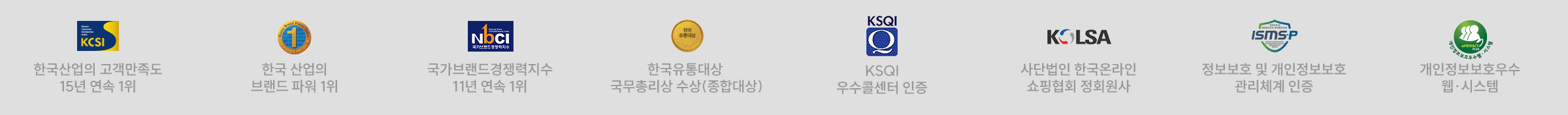신경숙
Shin Kyung-Sook
국내작가
문학가
1963 ~
인간 내면을 향한 깊은 시선, 상징과 은유가 다채롭게 박혀 빛을 발하는 문체, 정교하고 감동적인 서사를 통해 평단과 독자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한국의 대표 작가다. 1963년 1월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6학년 때야 겨우 전기가 들어올 정도의 시골에서 농부의 딸로 태어난 그녀는 열다섯 살에 서울로 올라와 구로공단 근처에서 전기회사에 다니며 서른 일곱 가구가 다닥다닥 붙어 사는 '닭장집'에서 큰오빠, 작은오빠, 외사촌누이와 함께 한 방에서 살았다. 공장에 다니며 영등포여고 산업체 특별학급에 다니다 최홍이 선생님을 만나 문학 수업을 시작하게 된다. 컨베이어벨트 아래 소설을 펼쳐 놓고 보면서, 좋아하는 작품들을 첫 장부터 끝장까지 모조리 베껴 쓰는 것이 그 수업 방식이었다. 그 후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한 뒤 1985년 『문예중앙』에 중편소설 「겨울우화」로 신인문학상을 받으며 등단하였다.
스물두 살에 등단하였을 때는 그리 주목받는 작가는 아니었다. 1988년 『문예중앙』신인상에 당선된 뒤 창작집 『겨울우화』를 내었고, 방송국 음악프로그램 구성작가로 일하기도 하다가 1993년 소설 『풍금이 있던 자리』를 출간해 주목을 받았다. 『강물이 될 때까지』,『풍금이 있던 자리』,『오래 전 집을 떠날 때』,『딸기밭』, 장편소설 『깊은 슬픔』,『외딴방』,『기차는 7시에 떠나네』 『바이올렛』 등 일련의 작품을 통해 "말해질 수 없는 것들을 말하고자, 혹은 다가설 수 없는 것들에 다가서고자 하는 소망"을 더듬더듬 겨우 말해 나가는 특유의 문체로 슬프고도 아름답게 형상화하여 199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로 자리잡았다. 신경숙의 첫 장편소설 『깊은 슬픔』은 한 여자와, 그녀가 짧은 생애 동안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작가는 그 여자 '은서', 그리고 '완'과 '세'라는 두 남자를 소설의 표면에 떠올려놓고 있다. 그들 세 사람을 맺어주고 환희에 빠뜨리며 절망케 하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의 올이 얽히고 풀림에 따라, 고향 '이슬어지'에서 함께 자라난 세 사람의 운명은 서로 겹치고 어긋난다. 그러나 『깊은 슬픔』이 정밀하게, 더없는 슬픔과 안타까움이 실린 시선으로, 그리하여 진하고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키며 그려 보이는 것은, 그들의 사랑과 운명이 화해롭게 겹치는 국면이라기보다, 자꾸만 어긋나면서 서로의 기대와 희망을 배반하는 광경이다. 아니, 차라리 그들의 관계에선 겹침이 곧 어긋남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불행했던 과거를 너무 쉽게 잊는다. 신경숙의 『외딴방』은 어제가 있어서 오늘이 있고 내일이 존재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망각한 채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려웠던 그 시절을 되짚어 보게함으로써 현재를 돌아보는 자성(自肖)의 기회를 만들어준다. 또한 이 작품은 작가의 자폐적 기질,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동경, 삶의 속절없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요히 수납하는 태도 등이 어디서 발원했는지를 알려주고 있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내성의 문학'이라 부를 수 있는 신경숙 문학의 정점이자 제목 그대로 외딴방에서 외롭게 죽어간 한 가여운 넋에 대한 진혼가라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신경숙은 자신의 체험을 질료로 한 글쓰기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과 그럼에도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의지 사이의 위태로운 줄타기를 보여준다.『풍금이 있던 자리』는 유부남과 불륜의 관계에 있는 여자가 그 남자와 새로운 삶을 꾸리려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성의 모습을 되짚어준다. 특히 화자의 기억 속에 있는 아버지의 새 여자와 어머니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삶에 찌들어 꾸밈이란 없이 소박하게 가정을 꾸려 나갔던 이 땅을 일구어낸 「어머니」와, 남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 땅의 「여성」과의 사이, 그 사이를 보여준다. 그 사이 속에는 무시 할 수 없는 사회 통념이 들어가 있다. 「어머니」를 긍정해야하면서 동시에 부정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이중적 잣대는 있지도 않는 풍금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 내고 제 3의 새 여자, 또 다른 화자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을 작가는 이야기 한다.
2007년 겨울부터 2008년 여름까지 「창작과비평」에 연재되어 뜨거운 호응을 얻은 『엄마를 부탁해』는 섬세하고 깊은 성찰, 따뜻한 시선의 작가의 절정의 기량으로 풀어낸 엄마 이야기이자 엄마를 통해서 생각하는 가족 이야기이다. 늘 곁에서 보살펴주고 무한정한 사랑을 주기만 하던,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존재하는 것으로 여긴 엄마가 어느날 실종됨으로써 시작하는 이 소설은, 가족들 각자가 간직한, 그러나 서로가 잘 모르거나 무심코 무시했던 엄마의 인생과 가족들의 내면을 절절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 작품은 2011년 'Please Look After Mom'라는 제목의 영문판이 제작되어 출간 전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미국 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22여 개국에 판권이 판매되었다.
일곱번째 장편소설인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는 사랑의 기쁨과 상실의 아픔을 통과하며 세상을 향해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청춘세대를 향한 신경숙 문학의 간절하고 절실한 소통의 발신음이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쳀 시대와 시간을 뚫고 나가 어떻게 서로를 성장시키며 불멸의 풍경이 되는지를 여러 개의 종소리가 동시에 울려퍼지듯 보여준다. 팔 년 만에 출간되는 여섯번째 소설집 『모르는 여인들』은 세계로부터 단절된 인물들과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풍경들을 소통시키기 위한 일곱 편의 순례기로, 익명의 인간관계 사이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작가는 특유의 예민한 시선과 마음을 집중시키는 문체로, 소외된 존재들이 마지막으로 조우하는 삶의 신비와 절망의 극점에서 발견되는 구원의 빛들을 포착해내어 이 시대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바닥 모를 생의 불가해성을 탐색한다. 2013년에 출간한 『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명랑하고 상큼한 유머로, 반짝이는 스물여섯 편의 짧은 소설들을 담은 소설집으로, 산다는 것과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 일상의 순간들에 스며들어 그리움이 되고 사랑이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달에게 우리의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짧은 형식의 글이자, 달이 듣고 함빡 웃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엮었다.
이외의 작품으로 소설집 『강물이 될 때까지』, 『감자 먹는 사람들』, 『오래 전 집을 떠날 때』, 『딸기밭』, 『종소리』, 장편소설 『기차는 7시에 떠나네』, 『바이올렛』, 짧은 소설집 『J이야기』, 산문집 『아름다운 그늘』, 『자거라, 내 슬픔아』, 『산이 있는 집 우물이 있는 집』 등이 있다.
- 최신작
-
[직수입일서] 父のところに行ってきた
[도서] 잊을 수 없는 밥 한 그릇
[외서] I Went to See My Father





.jpg)